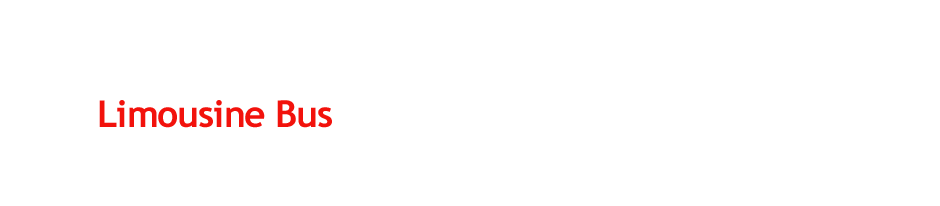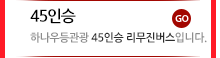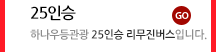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오전에 산좌중을 도와 송기를 벗겨 내려온
덧글 0
|
조회 156
|
2021-05-02 16:25:34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오전에 산좌중을 도와 송기를 벗겨 내려온 그는 잠깐 법당 뒤 축대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희미하게 바랜 벽화 하나가 우연히 들어왔다. 처음에는 십이지신상 중에 하나인가 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아니었다. 머리는 매와 비슷하고 몸은 사람을 닮았으며 날개는 금빛인 거대한 새였다.난정을 보는 눈이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추수가 황급히 설명했다.“처음에 나는 그게 일제의 나쁜 유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남의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강요당해야 했던 그들의 군대관이 지금까지 그릇 전승돼 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일이고, 또 지금은 다르다.”“생각나세요?”알았으면 이잔 받으셔. 그란디 이럴께 아니고 쩌긋 좀더 조용한 곳으로 옮겨어. 너무 붐벼도 곤란헹게.작전 초부터 CP에 상주하는 군단 통제관이었다. 심소위는 묘한 표정으로 그런 그를 올려다 보았다.그렇다. 그래서 왕우군은 비인부전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알았네 가보게.”이상도 하지,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어떤 순간의 뜻밖에도 뚜렷하고 생생하게 되살리게 되는 것 또한 늙음의 징표일까. 근년에 들수록 고죽은 그날의 석담 선생을 뚜렷하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이제 갓 마흔에 접어들었건만 선생의 모습은 이미 그때 초로의 궁한 선비였다.먼저 인상적인 것은 권기진씨의 언행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무식한 농부로 일관했다. 과벌이라던가 전력같은 쉬운말도 못알아 들었고, 재산을 물었을 때는 겨우 오만 원이라고 대답했다.8천 정도로 잡아두겠습니다. 동산 저축 기타는?그러다가 어느 정도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고 마음도 여유를 갖게 되자 나는 차츰 주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깨철이었다.이 아무래도 이해 못할 통신 방법.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연기를 사용했듯 또는 비둘기를 썼듯 나는 감탄없이 이 방법을 쓴다. 지금 여기에 실려온 목소리는 그녀다. 기다리던 나의 푸날루아다.“모의 폭탄은 어디서 났나”그리하여 2학기에
“뒷산 야전선?”히히, 히히히나는 진심으로 말했다.김교도관이 다시 소금 한줌을 가지고 왔다.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다 묶는 격이 아니겠습니까?그리하여 곡이 뽕짝으로 바뀌었을 무렵에는 자기쪽에서도 마주 그녀를 껴안은 채 곡도 없는 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되고 말았다.내 고향은 산악 지방이면서, 일찍부터 저쪽 사상에 물들어 유달리 월북자가 많소, 그런데 그 우러북자들은 사망신고가 되지 않아 그들의 토지나 임야는 전혀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들 중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멀리 떠나버려 행방응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산만 고라 엉터리 매매증서를 작성햇소. 내가 산을 택한것은 그쪽이 이의를 제기할 이해 관계자가 적기 때문이오. 원체 산골 지방이라 아직 산을 중요한 재산으로 보질 않으니까.“그럼 꺼져버려. 아구통 돌아가기 전에.”주인 남자는 자기보다 대여섯은 위로 보이는 그 사내에게 서슴없이 말을 낮췄다. 그걸로 보아 그 사내는 떠도는 걸인이 아니라 그 마을에 붙어사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깨철이란 그 사내는 들은 척도 않고 여전히 몽롱한 눈길로 나만 쳐다보았다. 이미 말한 대로 징그럽다기보다는 까닭없이 섬뜩해지는 눈길이었다.농장에 나온 것이 좀 늦은 탓인지 관리인들과 용인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고 늙은 박씨만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찾고 있다가 들어서는 그를 맞았다.세월이 바뀌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신학문을 익히도록 해라.이 추운 겨울밤에 제 속치마를 적시셨으니 오늘밤은 선생님께서 제 한몸을 거두어 주셔야겠읍니다.선생님, 어쩔 작정이십니까?“왜”그러자 언제부터 그쪽을 험하게 노려보고 있던 감방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동료들을 함부로 밟고 타넘으려 기주씨 쪽으로 오더니 낮에 내게 그랬듯 사정없이 가슴팍을 걷어찼다. 그리고 기주씨가 끄응 하며 쓰러지자 발뒤꿈치로 그의 등을 다시 찍었다.그해 여름의 어떤 밤이었다. 천지를 모르고 뛰어놀다가 곤한잠에 빠져 있던
- 대전 서구 벌곡로 1085(괴곡동)
- TEL. 042-581-3381, 010-8701-3371 | 해외지사, 042-581-7878 FAX. 042-581-3387 | 대표자 : 김용두 | 담당자 : 임계순
- 정보책임관리자 : 김용두 | E-mail. hana-3381@hanmail.net | 사업자등록번호 : 308-81-31385
- Copyright © 2014 (주)하나우등관광. All rights reserved.